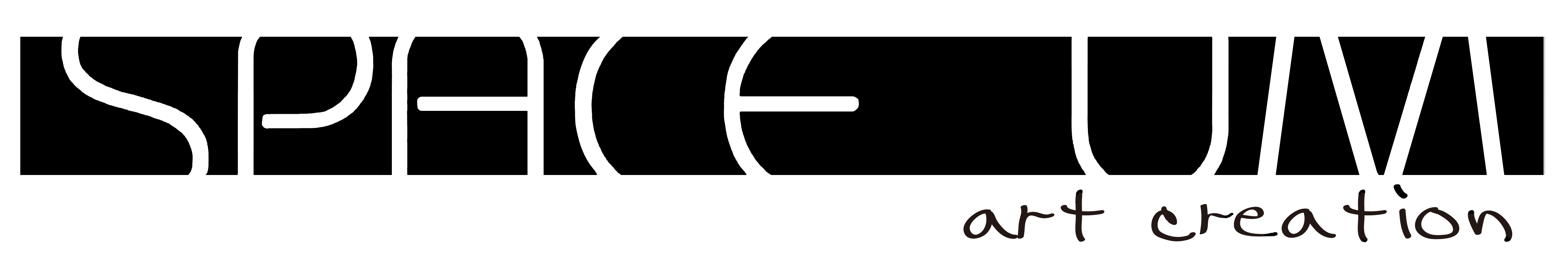자유밀생도감 - 김영진
가격 문의 바랍니다.
자유밀생도감
72.7cm x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2
* 작가와 갤러리가 서명한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 작품사진을 클릭하시면 작품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72.7cm x 53cm
캔버스에 아크릴
2012
* 작가와 갤러리가 서명한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 작품사진을 클릭하시면 작품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야기가 있는 풍경, 풍경에 대한 이야기
★김영진
기억은 그 자리에 두었을 때 가장 돋보이고 순수할 수 있다. 읽혀지고 떠올릴수록 변형되다 보니 꺼내면 꺼낼수록 닳아버리는 게 기억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각은 무수한 분열을 발생시켜 파편처럼 흩어지기도 하고 재조합을 통해 변형된 기억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는 얼핏 혼돈으로 보일만큼 무질서하지만 그 속에는 규칙이 존재하고 무질서 간에 균형을 통해 형상적 기억체계를 지속시킬 수 있기도 하다. 무질서 간에 균형의 개념은 Gilles Deleuze의 ‘chaosmos'로 Plato의 "형태 혹은 본성이 카오스의 외부로부터 왔다"는 말을 뒤엎는 개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되는 과정이 외부의 입각한 것이 아니라 카오스에서 자생 된 에너지가 중간 과정격인 카오스모스를 거쳐 코스모스를 향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통해 회화에 있어 세계관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던져 주었고 실질적으로는 작품의 구상 이전에 물감을 캔버스에 끊임없이 뿌리거나 뒤섞는 추상의 상태 즉, 카오스의 상태를 평면작업의 기초로 삼게 되었다. 재미난 점은 의외로 여러 색이 뒤엉켜 복잡하고 강렬한 카오스 상태의 평면을 바라볼 때 하얗거나 단색의 평면보다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감으로 이뤄진 카오스 상태의 화면을 다시 여러 번 얇게 덧칠하며 기억의 형상을 그려 나간다.
 ▲ 김영진, 4월의 눈193.9x130.3cm, Acrylic & Oil on Canvas, 2012
▲ 김영진, 4월의 눈193.9x130.3cm, Acrylic & Oil on Canvas, 2012
주제로써는 유년기의 기억으로 순수성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담고자 순차적인 나열이 필요했다. 한번쯤 봤을 법한 장면인 뛰노는 아이들과 산으로 둘러쌓은 마을의 전경, 금방이라도 꽃잎을 휘날릴 것 같은 나무,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 이름 모를 잡초 등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익숙한 대상을 통해 소통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고 결과물로써 ‘이야기가 있는 풍경’연작을 그리게 되었다. 이 연작의 중점은 주로 희로애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무색에서 시작하여 파스텔 톤의 푸른색 풍경과 분홍색 풍경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던 중 2008년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있는 풍경 연작이 2010년을 기점으로 유년기의 재현(또는 재생)에서 시기의 전후를 아우르는 풍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원인은 언젠가는 유년기라는 기간의 한계를 넘어야 했었고 Walter Benjamin의 <베를린의 어린 시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로지아’의 대한 글을 읽을 뒤 지각하지 못하던 유년기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골목마당으로 통하던 그늘진 로지아에서 시간은 낡아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집 로지아에서 맞은 오전 시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 로지아의 오전 시간은 더 자신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다. 하루의 남은 시간도 그랬다. 결코 그 곳에서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시간은 언제나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마침내 그 시간을 찾아냈을 땐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 Walter Benjamin, <베를린의 어린 시절> 중 ‘로지아’
 ▲ 김영진, 숲 속에 식사 235x27.3cm, Acrylic & Oil on Canvas, 2012
▲ 김영진, 숲 속에 식사 235x27.3cm, Acrylic & Oil on Canvas, 2012
확장된 주제는 화폭에서 유희(遊戱)를 즐기는 장면을 넘어 구체적 행동으로 묘사 될 수 있겠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풍경에서 찾았어야 했다.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지각의 세계에선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나와 세계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각적으로 인물보다 풍경의 배율이 높아짐으로써 군집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고 군집을 이루는 풍광은 넓은 세상에서 나의 모습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주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지표가 되기도 했다. 뛰어난 철학가의 이론이 담겨있지는 않더라도 분명 소생(疏生)의 이유를 사색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군집 속에는 지각된 환경과 생물 이외의 또 다른 존재를 암시하는 샤머니즘의 상징물을 묘사한 점은 아무리 체계적이고 인과관계가 정확한 세계일지라도 지각만으로 세계관이 이뤄질 수 없으며 과학과 철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나 풀리지 않은 현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과학적인 부분 또한 세계의 구성요소라 생각하여 토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서낭목’을 화폭에 담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품 ‘돌아가는 길’ 연작에서는 꽤 오래된 기억이겠으나 어렸을 적 행상(行喪)을 보고 오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여(喪輿)를 화면에 담아 보았다. 종소리의 청각적 측면과 형형색색의 꽃가마는 의미를 제외한 조형요소에서 축제에 가깝게 인식되었지만 막상 행상에 참여 했을 때 느껴지는 엄숙함은 화려한 이미지와 사뭇 대조적이다. 이런 엄숙한 순간은 한 사람으로서 가장 평안(平安)한 시간이자 생물학적 의식 이상의 인지력이 있다면 스스로 삶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연작을 통해 변질되지 않은 오해 또한 순수한 기억의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김영진, 자유소생도감 672.7x72.7cm, Acrylic on Canvas, 2012
▲ 김영진, 자유소생도감 672.7x72.7cm, Acrylic on Canvas, 2012
이렇듯 회화 작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삶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것은 유년기라는 미시적인 시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인생관을 세우고 다시 단계별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태도이며 소밀(疏密)의 구분이자, 혼돈과 질서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의 카오스모스’와 흡사하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코스모스의 세계를 꿈꾸지만 카오스가 없이는 도달 할 수 없고 더 서글픈 점은 생물학적으로 육체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삶의 순리에 따라 각자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도 수많은 모순은 언제나 야기된다. 그래도 사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이런 악조건마저 회화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의 이런 면을 회화로 재현함으로써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